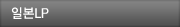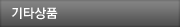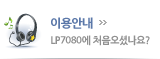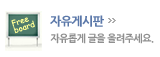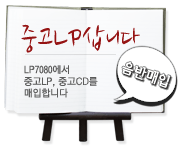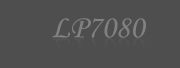HOME > 공지사항

| [담아온 글]청초 우거진 골에''''''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1 |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댓글 19인쇄신고 어유당 IP : 5f3b1578a3ce8fe 날짜 : 2010-05-30 21:26 조회 : 12646 본문+댓글추천 : 4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좋아하거나 닮고싶은 사람이 한 두 명쯤은 있게 마련이다. 개인의 추구성향에 따라 그 대상은 달라질 수도 지겠지만 지금 내게 조선조 최고의 멋쟁이를 한 명 말하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백호(白湖) 임제(林悌)를 꼽을 것이다. 문무를 겸했고 기와 예에 능했었던 조선조 최고의 로맨티스트. 그러면서도 가슴속에 민족의 자주의식 쟁취와 인간 평등을 꿈을 소명처럼 간직하고 소신과 열정으로 살다간 사람. 입추라는 말이 무색하게 뜨거운 열기와 두 주가 지나도록 낫지 않는 치통의 아픔 속에서도 나는 어디에선가 낚시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에 젖어있었다. 하긴, 급작스런 발병으로 종합병원 구강외과의 수술대에 누워 체질적인 이유로 마취가 덜된 상태에서 살을 째고 피고름을 빨아내는 극한의 고통을 참는 방편으로도 찌오름을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쯤 되고 보면 낚시는 이미 내 피와 살 속에까지 파고들어 와 섞여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임제가 태어나서 자란 회진마을 뒤편의 작은 소류지에 헐떡거리며 앉아있다. 백호 임제(白湖 林悌) 선생은 조선조 명종ㅡ선조 때의 문인으로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자순(子順), 호는 백호(白湖)·풍강(楓江)·벽산(碧山)·소치(嘯癡)·겸재(謙齋)이며. 아버지는 충청도 병마절도사 전라도 수군절도사 등 5도 절도사를 지낸 진(晉)이다 R6_essay09072222.jpg 저수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엊그제 비로 인해 만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물빛은 탁해 보였지만 흙탕은 이미 가라앉아 있었고 준수한 산세가 저수지 건너편의 산자락으로 흘러내려 울창함을 만들고, 잘 자란 다랭이 논의 벼는 막 출수(出穗)를 시작하고 있었다. 상류 물 버들 언저리에 대를 폈다. 수심은 2.9칸에 이미터 남짓 오전 아홉 시의 저수지는 온통 내 차지였다. 떡밥을 개기 시작했다. R20_essay08541420.jpg 한겨울에 부채 준다 괴이하게 생각 마라. 너는 아직 나이 어려 아무 것도 모르겠지 만 상사병으로 한밤중에 가슴에 불날 때면, 유월 무더위에 비할 바 아니니라. 莫 怪 隆 冬 贈 扇 杖 (막괴융동증선장) 爾 今 年 少 豈 能 知 (이금년소개능지) 相 思 半 夜 胸 生 火 (상사반야흉생화) 獨 勝 炎 蒸 六 月 時 (독승염증유월시) 이 한시(漢詩)는 백호(白湖)선생이 한 겨울에 어린 기녀에게 부채를 하나 선물하면서 그 부채에 적어준 것이라고 전해 온다. 사랑에 대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해석이 기발한 시상(詩想)과 능숙한 표현으로 한편의 시에 응축되어 마음으로 미소 짓게 만드는 듯 한 느낌이다. 사랑의 열기를 어찌 유월 더위에만 비하겠는가!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것은 얼음이나 냉수가 아닌 부채여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완벽한 조언인가!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난다 누었난다 홍안(紅顔)은 어듸 두고 백골(白骨)만 무쳤난다 잔(盞)자바 권(勸)한이 업스니 그를 슬허 하노라 파격(破格)의 시다. 서도병마사로 임명되어 부임하는 길에 황진이(黃眞伊)의 묘에 들러 읊었다는 이 유명한 시 한 수는 체통과 체면만이 최선으로 치부되던 조선 유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당파싸움으로 얼룩져있던 당시, 정적들에게 공략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사대부가 일개 죽은 기생을 흠모하여 묘를 참배하여 시를 짓고 치제(致祭)했다 하여 빈축을 사고 급기야 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파직을 당했으며, 이 후 사색당쟁(四色黨爭.)의 벼슬길을 스스로 버리고 야인으로 돌아가 풍류와 풍운의 일생을 지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선생은 조선조 낡은 인습과 도덕률에 얽매인 양반들의 의식구조를 풀어 해쳐 버리고 가식과 위선에서 벗어나 마음껏 사상의 자유로움을 펼친 호방한 기질의 행동과 문학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평양 기생 일지매와 사랑에 빠진 일화로도 유명하다. 당시 지체 높은 사대부가 기생의 무덤에 시를 바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그러한 멋스러움과 파격을 그 시대 임제가 아니고는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북천이 맑다 커늘 우장(雨裝)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초겨울 우비도 없이 흠뻑 찬비를 맞은 백호가 평양기생 한우(寒雨=찬비)의 집으로 뛰어들며 거는 수작시(酬酌詩)이다. 다분히 의도적인 방문이지만 한우는 그의 장부다운 호방한 기개와 풍류에 반해 마음을 열어 이런 나긋나긋한 답시(答詩)를 보낸다. 어이 얼어 자리, 무슨 일로 얼어 자리, 원앙 베개와 비취 이불을 어디 두고 얼어 자리,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녹아 잘까 하노라 그리고는 좋았을 것이다. 마냥 좋았을 것이다. 맘이 이미 녹았으니 무엇인들 녹지 않았겠는가! R22_essay08550069.jpg (채집망 속에 있는 참붕어를 노리고 꽃뱀(유혈목이) 한마리가 뛰어 들었다) 병을 핑계 삼은 오랜 휴식이 심신의 피로를 풀어 준 것일까? 오랜만에 나선 낚시였지만 나는 의외로 여유로 왔다. 헛챔질로 두 시간 여를 보내고도 붕어의 모습조차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전의 어느 낚시보다 행복했다. 소류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다. 수면 위에서는 온갖 수서곤충(水棲昆蟲)들의 짝짓기 놀음이 감미롭고, 귓전에 들리는 유일한 소음은 매미소리와 산새소리 뿐. 그러한 해탈의 시간을 한 시간쯤 더 보내고서야 나는 비로소 첫 입질을 받는다. 깊은 수심의 느린 찌올림, 병원 수술대에서 살을 째는 아픔을 상쇄(相殺) 해주던 그 찌올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백호(白湖) 임제(林悌)는 사대부 문학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6세기말의 선조 시대에 주로 활약했으며 천재적인 재능과 개성적인 시풍으로 당대의 시단을 풍미했다. 동시에 그는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담은 여러 편의 우언소설(寓言小說)로 당대의 독서계와 후대 소설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래 소설사의 계통과 맥을 잇는 선구적인 소설가로 꼽히기도 한다. 또한 탁월한 문재(文才)와 함께 호방한 기개와 풍류 정신을 아울러 지니고, 시속(時俗)을 조롱하는 희학(戱謔)적 언행을 마다 않던 그의 개성과 사상은 수많은 일화로 유전되면서 그의 시문들과 함께 조선 사대부들의 지성사(知性史)에 지울 수 없는 자취를 남겼다 백호선생은 5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형제 모두가 당대의 이름난 시인이며 학자였다. 특히 어려서 어머니를 여윈 막내 동생 "탁'<호는 창랑(滄浪), 영산포에 있었던 정자 창랑정 의 주인>을 몹시 사랑하여 동생을 그리는 여러 편에 시를 남기기도 했다. 창강의 연월(烟月) 속에 낚싯대 하나, 어옹(漁翁) 혼자 기러기 노니는 모래사장에 잠이 드니 갈대 잎 소소히 밤 서리 만 하얗더라. 새벽바람에 저자에 나가 고기 팔고 돌아와 술 한잔에 취했어라 강 하늘은 벌써 석양 일래. 부귀와 공명도 나는 원치 않고 그대와 함께 창랑곡(滄浪曲)을 부르고 싶어라. R27_essay08552766.jpg 첫 수는 여섯치 붕어였다. 일반 계곡지 붕어의 패션모델 같은 갸름한 모습과는 달리 이곳붕어는 스포츠 댄서 같은 탄탄한 몸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초 속으로 야무지게 파고들었다. 두 치수는 크게 생각게 하는 힘이었다. 심심지 않게 입질이 이어졌다. 시원한 찌올림과 함께 여섯치를 전후한 씨알들이... 시계는 두 시를 넘어서고 있었고. 기온이 오르면서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등줄기에 굵은 땀방울이 흐르고 허전한 뱃속과 더위를 동시에 해결할 수단으로 쿨러 속의 캔 커피 하나를 꺼내 뚜껑을 따는 순간 두 칸 반대의 예신을 감지했다. 몇 번이나 망설이다 오르는 찌, 한마디, 한마디 물 속에서 벗어나는 찌톱을 보며 그 크기가 일곱 마디쯤 높아졌을 때, 짧게 퉁기는 내 특유의 챔 질이 이어졌다. 붕어는 반사적으로 물버들 가지사이를 향해 치고 들었다. 온전치 못한 엘보우 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강력한 반발에 잉어가 아니면 대물붕어 일 것임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고 몸을 일으키고 팔을 뻗어가며 고기의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그 박빙의 순간은 생각보다 오래갔다. 좌측의 물버들 가지만 피하면 힘든 장애물은 없었는데도 붕어의 모습을 확인하는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녀석의 힘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증거 일게다. 그리고 붕어의 크기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황당했다. 아무리 크게 보아도 아홉치를 벗어나지 못할 녀석이었다. R23_essay08555867.jpg (황진이를 보잤더니 향단이가 나왔구나!) 임제는 서른이 넘어서는 주로 영남지방을 유람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고 전국 각처를 누비며 몸으로 느낀 서민의식을 시로 표출했다. 39세를 일기로 요절할 때까지 그가 지은 시는 1천수가 넘는다. 호탕하고 기발한 그의 시는 항시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당시의 대문호 신흠은 「백호문집」서문에서“내가 백사 이항복과 만나 임백호를 논하기가 여러 번인데 매양 기남아(奇男兒)로 일컬었고 또 시에 있어서는 그에게 구십리(九十里)나 훨씬 뒤떨어져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백호는 운명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나라마다 독립국가를 자처하나 오직 우리 나라만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유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 마지막 남긴 한 맺힌 말은 백성들의 가슴속에 자주의식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지정학적 측면도 있겠지만 중화주의(中華主義)에 동화되어 비민족적인 주자학의 세계관에 빠진 조선시대의 부패상을 통탄해하고 민족적 자아의식을 빨리 갖고자 외친 조선조 최고의 풍류남아(風流男兒)이자 참 선비 백호 임제, 그는 아마도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산천을 바라보며 시심(詩心)을 키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R0_essay08505881.jpg 한나절의 워밍업 낚시, 대를 거두며 나는 잠시 임제(林悌)가 된다. 퇴조가(退釣歌)다. 네가 보고싶은 맘이 열병으로 도졌더냐. 살 타지는 땡볕에도 찌 세우고 기다린걸 문전박대(門前薄待)하고 한나절을 그저 두니 학수고대(鶴首苦待) 지친 몸을 일으킬까 하노라! 물 속에서 대물붕어가 부르는 유혹의 노래가 들려 오는 듯 하다. 기다리지, 기다리지 조금만 더 기다리지, 단골손님 오신 대서 치장(治粧)하다 늦은 것을 서운한 맘 거두시고 한 걸음만 더디 가면 공(功)들여 가꾼 몸매 보여줄까 하노라! 몇 해 전 입추 무렵 어유당(魚有당) |